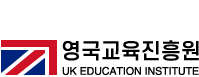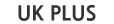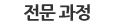유용한 정보
영국교육진흥원이 여러분께 드리는 생생 영국 정보!
진짜 영국이야기
영국 (Great Britain)

영국의 정식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대 브리튼(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국 본토섬)과 북아일랜드에 있는 연합왕국이지요. 국토로만 본다면 이 외에도 지브롤터를 비롯해 포클랜드제도, 채널아일랜드 등을 지배(혹은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 이전까지는 홍콩까지도 속령으로 관리하는 등, 인도,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아시아의 약 1/3에 해당하는 국가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던, 한때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나라이자 현재는 문화, 교육, 금융 산업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겨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용어는 영어(만이 아니라)와 웨일즈어이며, 민족은 크게 잉글랜드의 앵글로 색슨족과 다른 지역의 켈트족, 역사적으 로 보면 4개의 국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가 합쳐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공식적으로는 영국국 교회(성공회)와 개신교, 로마가톨릭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정치의 본산이면서도 굳건하게 God Save the Queen!을 외치는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현재의 영국은 과거에 비해 많이 영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의 크기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금융, 산업, 문화 전반에서의 퇴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쩌면 영국을 뒷받침하던 물질적 토대가 아니라 전통과 습관,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예술의 나라

학문적, 산업적, 정치적 성과에 비해 중세나 근대에 이룬 예술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문학권으로만 한정 해본다면, 영국인들의 현실주의적 경험주의적 성향은 문학과 연극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 낭만시인 바이런, 셜리, 키츠, 빅토리아시대의 테니슨과 브라우닝, 20세기의 예이츠 등 거장급 시인들과 세익스피어로 대변되는 극작을 통해, 현재 영국에는 1800여 개의 극장에 한 주에만 약 190만명의 관람객이 들기도 하죠. 특히 런던은 드라마, 음악, 오페라, 댄스의 세계적 중심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명한 로얄오페라 코벤트가든, 잉글리시 국립 오페라단 등이 이에 속해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적 역량은 특히 음악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비틀즈를 비롯 롤링스톤즈, U2 등, 현대에 있어서도 Jazz, Pop, Classics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유명한 연주자와 뮤지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문화탐방의 기회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인은 소소한 그들의 역사를 박물관처럼 보존하고 있습니다. 소설속 장소이기만 했던, 셜록홈즈의 베이커 스트리트 사무소, 예이츠가 시를 창작하던 집, 디킨스의 집 등이 보존되어있으며 일반인에게 유료 혹은 무료로 공개되어 과거와의 대화를 이끌어 줍니다. 전시와 관련해 영국이 돋보이는 점은 수다한 전시와 기획이 대개는 무료로 대중에게 공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만원씩이나 주고서도 사람에 치여 간신히 몇 점 보고 나올 법한 전시들을 영국인들은 가족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심지어 부랑자들에게까지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문화적 욕구가 많은 학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장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느긋한 사람들

처음 영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여기가 정말 선진국이라는 영국이 맞나?라고 의심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에 비해 최소한 2 배에서 3배까지 소득이 많고, 지난날이기는 하지만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초라하기 그지없는 집과 자동차들을 보면 정말이지 여태 무언가에 단단히 속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슬라이딩 도어즈]에서, [러브 엑츄얼리]에서, [어바웃 어 보이]에서 보였던 길과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영국이 있던 것을 금새 알 수 있지요. 그들의 삶이 눈에 들어올 때쯤이면 그들의 느림도, 딱딱함도, 앞뒤 꽉막힌 융통성없음까지도 한편으로는 그리운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하는데만 2달이나 걸리는 느려터짐. 오늘하다 못해서 내일하고, 또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철저하지 못함에 숨이 넘어 갈 듯할 지도 모릅니다. “당장 오늘”이 없는 대화에서 오는 느긋함에 짜증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영국을 느끼고 싶다면, 당장 (이것도 영국적인 방식은 아니겠지만) 집을 나가 동네 파크에 한번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차를 타고 무작정 웨일즈 북서부로 들어가 하루나 이틀쯤 묵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리지만 정해진 길을 가는 그들을 보면서, 속도에 목을 매고 살아 온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지만, 학교가 끝나고 한가로이 돌아가는 길의 펍에서 맥주 한 잔을 들고, 동네 호숫가에 앉아 한 시간정도 멍하니 눈을 감고 있는 호사가 영국생활에서는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나라
하루의 날씨는 여름과 겨울을 왔다갔다하고, 한 시간의 날씨는 소나기와 강풍과 햇빛과 흐린날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리에서는 어느 때든 코트를 걸쳐입은 할머니들과 맨살을 거의다 드러낸 히피들을 볼 수 있기도 하죠. 이렇듯 영국은 신구의 조화가 아니라, 신구가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어색한 것, 이상한 것, 개성적인 것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이상한 공간이기도 하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영국은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개성있고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 중의 하나입니다.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고, 강한 듯하면서도 약하고,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축구장의 훌리건이 존재하고, 조용하게 정원만 가꾸는 듯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의 안에 진짜 영국이 존재합니다. 굳이 한 마디로 정의를 해야한다면,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정도가 적당할 지도 모릅니다.





 영국교육진흥원 02-585-0293 SINCE 2002
강남역 5/8번 출구 100M, 비트빌 1105호
영국 문화원 주관 영국유학 Specialist
전문가 레벨 자격 보유 Since 2007
Trained by British Council July 2011 - June 2017
Quality English Authorised Agent
English UK partner agency
영국교육진흥원 02-585-0293 SINCE 2002
강남역 5/8번 출구 100M, 비트빌 1105호
영국 문화원 주관 영국유학 Specialist
전문가 레벨 자격 보유 Since 2007
Trained by British Council July 2011 - June 2017
Quality English Authorised Agent
English UK partner agency